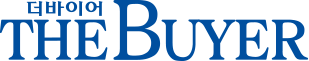Benjamin Joinau 홍익대학교 교수 유럽 HMR 시장 대세는 조리 편한 구르메 콘셉트 요리
유럽 HMR 시장을 이끄는 동력은 뭘까. 프랑스 출신 벤자민 주아노 홍익대학교 교수를 경복궁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조리하기 편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구르메 콘셉트 HMR이 강세라고 전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HMR 시장은 얼마나 발전했나?
아주 많이 발전했다. 프랑스에는 가볍게 즐기는 델리카트슨 요리가 과거부터 인기가 많았다. 빵, 과자, 케이크 뿐 아니라 간단한 식사까지 가능한 냉동음식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 한국에는 아직 많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부터 유명 셰프들이 직접 제공한 레시피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문화가 발달했다. 또 냉동식품 전문 브랜드인 ‘PICARD’는 고급 HMR 식품들을 판매하는 걸로 유명하다(PICARD는 파리에만 123개 매장을 두고 있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에서도 영업 중이다).
HMR을 어떻게 ‘고급’으로 생산하나?
프랑스의 식문화는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단계가 있다. 순서도 있고, 차림새도 있다. 그런데 집에서 그렇게 차려먹으려면 요리하기가 아주 번거롭다. 그렇다고 한국처럼 외식을 자주 하지도 않는다. 정크푸드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바쁘면 라면 하나 끓여먹을 때도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걸 식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고기와 야채를 조금씩 곁들여 먹는다. 그러다보니 동봉한 재료로 조리만 하면 되는 밀키트나 반조리음식 시장이 커졌다.
한국 롯데마트가 프랑스 ‘띠리에’ 브랜드 냉동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PICARD와 비교할 수는 없다. 프랑스에서 띠리에는 PICARD보다 인지도가 낮다.
유럽에서 HMR의 주요 소비 계층은?
보보스(부르주아 보헤미안·실리와 여유를 중시하는 젊은 엘리트들)들이다. 이들은 경제력도 웬만큼 있고 기품있는 식문화를 지향한다. 하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중시하기에, 요리에 많은 시간을 쓰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보보스 족들이 고급 HMR의 주요 소비층이다. 이들은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HMR을, 외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조리해 먹는다. 미식을 합리적 가격에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들은 동네마다 흔한 슈퍼마켓 체인 MONOPRIX 등에서 HMR을 구매하기도 한다.

HMR을 ‘몸에 좋은 음식’으로 인식하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다. 유럽은 어떤가?
그 부분은 계층의 문제다. HMR 식품에도 여러 범주가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까다로운 요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식재료를 소분해 포장한 밀키트 제품과. 단순한 가공 햄 통조림은 동일한 HMR이라고 볼 수 없다.
프랑스에서는 동네 슈퍼마켓도 건강에 좋은 식재료들로 만든 HMR 식품들을 판매한다. MONOPRIX 매장만 해도 퀴노아, 아보카도 오일 등 슈퍼푸드를 주원료로 만든 HMR과 유기농 채소 샐러드를 구비하고 있다. 한국의 슈퍼보다 선택의 폭이 더 넓다.
유럽 HMR 제품들의 마케팅 전략은?
흥미를 유발하는 마케팅이 유행이다. 예컨대 ‘배고프지? 먹어봐!’ 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문구를 포장에 표기하는 것이다. 제품 그림도 복잡한 것보단 재미있고 단순한 것들이 눈에 많이 띈다.
평소에 HMR을 즐겨먹나?
화학 조미료 알러지가 있어서 잘 먹지 못한다. 하지만 강의 스케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면 삼각김밥, 반숙 계란, 컵과일로 식사를 대신할 때도 있다. 한국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HMR은 보기만 해도 조미료가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 아쉽다. 대표적인 게 도시락이다. 또 제품 선택의 폭도 아직은 좁은 편이다.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족발이나 매운 막창을 점심 대용으로 먹을 순 없지 않나(웃음). 그나마 최근엔 다양한 시도들, 특히 원재료의 퀄리티를 높이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