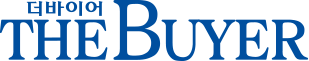별명이 막걸리였던 친구가 있었다. 양조장 집 아들이었다. 별명이 순두부였던 친구도 있었다. 두부 공장 딸이었다. 막걸리는 성격이 털털하고 얼굴도 늘 홍조를 띠었다. 어렸을 때부터 막걸리를 적잖이 마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이 들어 알고 보니 술을 입에도 못 댔다.
두부는 얼굴이 뽀샤샤했다. 백지처럼 흰 얼굴답게 말수도 적고 내성적이었다. 은근 백치미인 같았다. 이들의 별명이 가업에서 붙여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외모와 성격도 한몫을 한 셈이다. (아, 아이들의 통찰력이라니.)
막걸리를 마실 때 두부를 안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공교롭게도 막걸리 집 아들과 두부집 딸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때마다 친구들을 떠올리는 게 필연이 되었다. 유쾌한 추억이어야 하건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막걸리 집은 파산인가 뭔가를 당해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두부 집 딸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막걸리와 두부는 그런 점에서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는데,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염세철학이었다.
상 위에서 어울리는 한 쌍으로서의 막걸리와 두부는 공통점이 많다. 전국 어느 곳에서나 두루 생산된다는 것, 매우 서민적이고 가격이 싸다는 점, 희끄무레한 한민족의 색깔도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다. 뭔지 모르게 심심한 맛도 마찬가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신새벽부터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해뜨기 전 컴컴한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바로 일배식품의 특징이다. 유통기한이 짧고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는 상품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랬던 상품들이 지역상권에서 힘을 잃고 있다. 규모화된 브랜드 상품들의 파워에 밀리기 때문이다. 간혹 지역의 명성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사례들이 등장하지만 수익이 지역으로 귀결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두부 집들이 늘 궁금하다.
초당두부의 명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신새벽에 간수를 맞추던 초당 할머니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할머니들이 두부를 싣고 가던 리어카는 탑차로 바뀐 것을 알겠는데, 두부 만들던 집이 두부 전문 식당으로 바뀐 것도 알겠는데, 두부 만들던 할머니와 그 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늘 궁금하다.
(지난 겨울, 경포대 근처의 400년 역사 두부 전문식당이라는 곳에서 두부 상차림 식사를 했는데 맛이 너무 심심하고 밍밍했다. 알고 보니 두부 역사가 400년이라는 게 아니라 그곳 옆에 있는 고택이 400년이라는 얘기였다. 에구, 이 놀라운 마케팅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