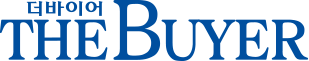닭강정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닭고기 맛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다는 말이 있다. 고기 맛보다 소스 맛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말을 공자가 했다는 것을 브런치 작가 ‘건빵’이 알려 주었다.
‘사람 중에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참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人莫不飮食也 鮮能知味也). -중용 4장’
공자와 비슷한 시대에 지구 반대편에서 살았던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의 요지는 이런 것이다.
‘수많은 직업의 전문가들을 만나 확인했더니, 자기 일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그야말로 취재정신이 뛰어난 사람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발로 뛰어 직접 확인했고, 그로써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앎’임을 알아냈다. 그에 비해 공자는 발로 뛰기보다는(선비는 뛰지 않는다고 강조한 대표선수였다) 앉아서 통찰하는 쪽을 택했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 입맛도 까다로워졌을 것이다. 공자가 음악을 사랑한 것도 이 추정의 작은 근거다(음악 좋아하는 이들 대부분은 맛에도 민감하다).
소스와 조미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소스는 찍어 먹는 것이고, 조미료는 조리할 때 뿌려 넣는 것으로 일단의 감을 잡는다. 소스를 떠올리게 하는 많은 형태들, 조미료를 떠올리게 하는 많은 상품들을 통해 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하다. 시장에서도 둘의 분류를 엄격히 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음식의 보조재라는 점이다. 맛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한 보조 역할자라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없다.
소스와 조미료는 역사적 출현도 헷갈린다. 소금이나 간장, 장류들이 일종의 소스였고 조미료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조미료에 대한 원성이 높아졌는데 그 시초는 ‘미원’으로 기억된다. 미원과 다시다로 상징되는 한국 식품업계의 대표적 전쟁이 끝난 뒤, 소비시장에서는 화학조미료와 천연조미료의 대립구도가 이어진다.
이런 구도를 통해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여기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이가 ‘화학’이다. 화학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마치 퀘퀘한 약품공장에서 화학물질을 뽑아내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무리들이 있다. 화학조미료로 터부시되는 MSG(글루타민산나트륨)도 다시마에서 발견된 자연산 추출물이고, 천연조미료로 알려진 것들도 사실은 화학적 조절을 통해 유통된다.
조미료는 말 그대로 특정한 맛을 증폭시키는 보조 역할자일 뿐이다. 거기에 기능성이니 건강성이니 하는 말을 더하는 것은 귀여운(또는 영악한) 상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만 조미료도, 소스도, 다른 식품들처럼 시대적 흐름을 탄다. 새로운 기호, 트렌드, 심리적 영향을 받아 뜨고 지는 것이다.
한때 조미료 세트는 명절 선물세트의 주요 구성원이었지만 이제는 뒤켠으로 밀려나 있다. 대신 각종 건강기능식품들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추세다. 시대에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는 것은 인간사도 마찬가지이니 화학조미료들에게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권하고 싶다. 그대 어차피 조미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