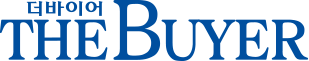기억에 관한 대화가 자주 나온다면 나이든 사람이다. 물론, 기억과 추억은 같으면서 다르다. 가까운 사람 중에 글을 못 읽는 분이 있는데, 그의 기억력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그가 말하길 “글을 모르니 기억해야 살 수 있었”단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뛰어나다. 인간 대부분이 글을 쓸 줄 모르던 시절에는 모든 것을 기억해야 했을 것이다. 기억력 좋은 사람이 경쟁력도 높았을 것은 자명하다. 오래 전 시카고대학의 논문에서 인용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읽은 것은 10%를 기억하고, 들은 것은 20%를 기억하고, 본 것은 30%를 기억하고, 듣고 본 것은 50%를 기억하고, 말한 것은 70%를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은 90%를 기억한다.’
과연 그런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듯하다는 생각은 든다. 인용출처를 보니 1975년도의 논문이란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할까, 의문이 들지만 마땅히 거부할 이유도 없다. 오래 전 미국의 학자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강조했지만, 글을 쓸 줄 모르는 분은 ‘말과 행동’, ‘보기와 듣기’ 따위는 기억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알려 주었다. 하기야 글을 모르는데 읽을 수도 없을 테니 저 인용문은 의미가 없다.
그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러니까 한 집에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자식의 분석에 의하면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것’이 기억의 원동력이라고 한다. 그의 가족들은 과거의 일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는다. 글을 모르는 모친의 기억이 언제나 맞았기 때문이다. 서로 간 기억이 다를 때 그가 늘 명확하게 정리한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 이후 어떻게 왜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지, 죽죽 정리해 준다. 결국 그의 기억이 기록보다 정확했다. 어떤 점에서 기록은 기억할 수 없는 이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언어학 분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남녀별 차이가 크다고 한다. 여성은 약 6000단어를 일상에서 사용하지만 남성은 약 5000단어 사용에 그친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결혼한 뒤의 남성들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고작 1800단어 수준이라나. (여성보다)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남자들의 언어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연계시키는 능력의 퇴화 따위가 원인이지 싶다.
기억의 백미는 ‘맛’의 재탄생이다. 어머니들이 만들어내는 맛의 일관성이야말로 무의식적 기억의 정점이라는 걸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단순히 반복적 조리 능력으로 해석하는 이도 드물 것이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본능이 추상의 맛을 구체화시키며 일관된 맛을 담보하는 것 아닌가. 어떤 사건이나 일화도, 어떤 말이나 행동도 기억의 변질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음식 맛은 또렷하게 기억하게 됨을, 가정의 달에나마 감사하게 기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