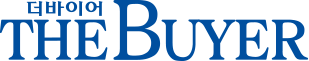밥 한술의 숭고함을 노래하다
밥 벌이는 밥의 벌이다.
내 저 향기로운 냄새를 탐닉한 죄
내 저 풍요로운 포만감을 누린 죄
내 새끼에게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이겠다고
내 밥상에 한 접시의 찬이라도 더 올려놓겠다고
눈알을 부릅뜨고 새벽같이 일어나
사랑과 평화보다도 꿈과 이상보다도
몸뚱아리를 위해 더 종종거린 죄
몸뚱아리를 위해 더 싹싹 꼬리 친 죄
내 밥에 대한 저 엄중한 추궁
밥벌이는 내 밥의 벌罰이다.
허기진 배에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 한술 뜨는 순간이 주는 위로. 아마 누구나 경험했던 일상의 행복 아닐까요. 하물며 자식들 입에 밥 한 술 더 들어갈 때면 모든 부모의 세상 시름이 잊히는 순간이지요.
밖에서 눈을 부라리며 아득바득 싸울 때도, 눈치를 보느라 머리카락이 곤두서도,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눈꺼풀이 내려와도, 스트레스로 어깨가 뻐근한 것도 불사하며 사는 것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이 준 멍에이자 영광이겠죠.
고은 시인이 ‘아버지’라는 시에서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극락이구나.’라고 썼습니다.
엣 말에 논두렁에 물대는 소리와 자식 목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다는 말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시인은 ‘몸뚱아리를 위해 더 종종거린 죄,’ ‘몸뚱아리를 위해 더 싹싹 꼬리 친 죄’라며 밥벌이를 하려는 우리 삶이 ‘벌’이라고 말합니다.
‘라면을 끓이며’ 산문집에 작가 김훈도 밥을 주제로 여러 글을 실었습니다.
“모든 밥에는 낚싯바늘이 들어 있다. 밥을 삼킬 때 우리는 낚싯바늘을 함께 삼킨다.
그래서 아가미가 꿰어져서 밥 쪽으로 끌려간다. 저쪽 물가에 낚싯대를 들고 앉아서 나를 건져올리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 자가 바로 나다. 이러니 빼도 박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한다. 밥 쪽으로 끌려가야만 또다시 밥을 벌 수가 있다.” 먹고사는 행위의 비애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갓 지어 살풋 날아갈 듯한 밥 한 알의 가벼움에 비해 ‘밥벌이’의 무게와 책무가 더없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삶의 아이러니를 닮은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