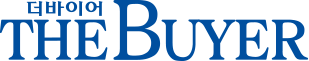칼바도스

그녀는 고개를 뒤로 한껏 젖히고 마셨다. 머리카락이 양어깨 위로 쏟아졌고, 그 순간 여자는 ‘마심’ 그 자체인 것 같았다. 라비크는 전에도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든 지금 하는 일에 송두리째 전념했다. 그것이 그녀의 매력이지만, 또한 위험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술을 마실 때면 술이 전부, 사랑할 때면 사랑이 전부, 절망할 때는 절망이 전부, 그리고 잊을 때면 모두 걸 잊는 그런 여자였다.
그런데 그녀가 열린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엄청나게 큰 국화꽃 다발을 안고, 문을 힘들게 통과하려는 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실루엣 그리고 크고 환한 꽃다발이 보일 뿐이었다. 꽃은 축축하고 차가웠다. 잎들은 가을과 흙냄샐 진하게 풍겼다.
나 역시도 여자와 함께, 창백한 빛깔의 국화꽃과 칼바도스 병 사이에 앉아있다. 사랑이라는 환영이 부르르 떨며 낯선 슬픔에 잠겨 나타난다.
책장을 넘기며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고 간단한 안주를 만든 경험은 누구나 있겠죠. 손에 잡힌 책이 찰스 부코스키의 책이었다면 아마도 마트에서 집어온 싸구려 와인이
라도 나쁘지 않았을 테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었다면 싱글몰트 위스키이거나 샐러드를 곁들인 맥주 한 병이 었을 것입니다. 레마르크의 소설 ‘개선문’이라면 두 남녀 주인공 다음 조연이 바로 칼바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1929)’로 유명한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는 독일 태생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국 독일의 나치스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며 미국으로 망명했던 망명작가입니다.
‘개선문’은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1946년 미국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100만부 이상이 팔려 나가며 세계적 고전문학으로 자리매김을 한 레마르크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나치를 피해 파리의 싸구려 호텔에서 살아가는 망명자들과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개선문’의 주인공은 외과의사 라비크와 여배우 조앙 마두입니다.
2차 세계 대전이 유럽 전역을 삼켜버린 뒤 마지막 피난처가 돼버린 프랑스 파리. 스산하고 축축한 겨울비가 연신 내리는 추운 파리 배경처럼 불안함과 절망에 빠진 두 주인공은 센 강 위에 놓인 개선문에서 가장 가까운 알마 다리 위에서 처음 만납니다. 베를린 종합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일하던 독일인 라비크는 독일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쫓기는 두 친구를 숨겨 주었다가 체포되고, 아내인 시빌은 고문으로 죽게 됩니다. 강제수용소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파리로 망명한 그는 불법체류를 하며 이름을 숨기고 대리 수술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언제든 고국에 밀입국하기를 기대합니다. 파리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혼혈 여인 조앙 마두는 위태롭고 공허해 보이지만 아름다운 여인으로 둘은 곧 사랑에 빠집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칼바도스를 마십니다.
“칼바도스 한 잔 더 할래?” 라비크가 물었다. 조앙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잔 더 주세요.”
그가 웨이터를 불렀다. “이거보다 더 오래된 칼바도스는 없나?” 웨이터는 갓난 애라도 안고 오듯이 팔에다 병을 안고 왔다. 병은 지저분했다. 관광객을 위해 그린 그림으로 장식한 병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술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더러워진 병이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조앙이 죽고 라비크는 파죽지세로 파리를 점령하는 독일군을 피해 망명자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도시를 떠납니다. 이때 개선문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개선문조차 이미 보이지 않았다.”
나치의 전횡과 세계대전에 압제받는 소시민의 고뇌, 이러한 불행한 시대의 제물이 된 남녀의 낭만적 사랑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비가 내리는 스산한 겨울밤이면 라비크와 조앙이 떠오릅니다. 언젠가 샹제리제 대로가 내다보이는 파리의 선술집에서 칼바도스 한 잔을 기울일 날을 기약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