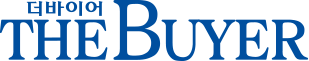흔히 피자를 미국 음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조는 로마이고 가장 일상화된 곳도 이탈리아다. 이탈리아 어디를 가도 (도시나 시골이나) 눈 돌리면 ‘PIZZA’ 간판이 보인다. Pizza는 ‘납작한 빵’이다. 저마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모양을 내고 맛을 낸다. ‘정통 이탈리아식’ 어쩌구 하는 말은, 그러니까 마케팅용이 틀림없다.
‘PIZZA’만큼 흔한 간판이 또 있다. ‘Gelato’다. Gelato는 ‘얼었다’는 의미, 즉 빙과다. 역시 이탈리아가 원조다(시칠리아 또는 피렌체). “이탈리아인 셋 중 하나는 젤라또 장인”이라는 말도 있다. 모두 저마다의 맛을 내기 때문에 가게마다 조금씩 맛이 다르다고 한다. 그러니 ‘정통 이탈리아식 젤라또’란 용어도 마케팅용 언어이자 ‘내 멋대로 만들었다’의 다른 표현이다. 뭐, 현지 고유의 특성은 있겠지만 정통이 어디를 말하고 무엇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기는 무리인 것이다.
그래서 또 물었다. 이탈리아에서 제법 오래 살아온 교포에게 정통 한국식으로 질문했다.
“여기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집은? 3대 젤라또가 있다는데, 그건 어디에?”
그 역시 한두 번 받은 질문이 아니었을 터, 다행히 친절하게 웃어 주었다.
“가장 맛있는 피자집은 몰라요. 있다 해도 입맛에 맞을지…. 한국인들이 젤라또 3대 명가란 말을 만들었다 하는데, 여기서는 별 관심 없어요. 다 맛있어요.”
오래된 지인들과 저녁 약속을 했다. 유서 깊은 고깃집을 찾았고 맛있는 차돌박이를 원 없이 먹었다. 무엇보다 서빙 아주머니가 마음에 들었다. 필요할 때마다 척척 와주었고, 무엇을 주문하든 쓱쓱 갖다 주었다. 마주앉은 선배가 말했다.
“이분과 내가 30년 인연이야.”
30년? 그렇다면 서빙 알바가 아니라 주인?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놀라운 답이 나왔다.
“30년 직장예요. 이 일 하면서 애들 다 키워 결혼도 시키고 손주까지 봤답니다.”
다시 한번 놀람. 아주머니도 놀랍고, 이 집 사장도 놀랍다. 선배가 결정타를 날렸다.
“가끔 내가 예약을 할 때 ‘나야’ 하고 말하는데, 한 번도 누구신데요? 하고 되묻는 법이 없어.
누군지 당연히 알고 있으려니 했는데, 여기 와서 보면 테이블에 ‘예약자 : 나야’로 돼 있는 거야. 서비스의 극치 아냐? 내가 이분한테 참 배우는 게 많아.”
놀람은 깨우침을 동반한다. 만드는 것에만 장인이 있는 게 아니라 서빙에도 장인이 있는 것이다. 만드는 기술만 기술이 아니라 서비스 기술도 기술인 것이다.
우리는 너무 ‘최고’를 숭상하고 ‘정통’을 좇으며 산다. 완전을 추구하는 인간 심리의 왜곡이다. 참으로 완전한 음식은 집안에서 늘 나오고 있고, 완전한 서비스를 지근거리에서 받고 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30년 서빙 아주머니에게 배운 깨달음… 이지만 사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