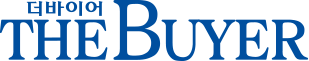“일본 유통은 실패 사례… ‘한국형’ 집중하라”
“일본은 더 이상 국내 유통업계의 벤치마킹 모델이 아닙니다.”
양석준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일본의 유통업계가 침체기를 걷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내 식품유통업계가 일본을 성공모델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유통환경 자체가 달라 벤치마킹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석준 교수가 말하는 한∙일 유통시장.

양 교수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유통환경은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일본백화점이 매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의 백화점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전 유통업계의 경우 일본의 대리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는 그 틀을 벗어났다. 일본 내 가전 대리점들이 매출 하락을 거듭하다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한국에서는 대형 종합유통업체들과 별도로 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한국형’ 대리점 형태로 정착하기 시작했다.
“국내 농업은 아직도 일본을 성공 케이스로 보고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실패한 모델입니다. 더 이상 규모가 줄고 있는 일본 시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본 유통시장, 한계점 노출
여기에는 일본 유통업계의 한계점이 간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다. 그는 일본 시장이 크게 2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인구 감소에 대한 무대책
√ 큰 틀의 개혁 엄두 못 내는 인식 구조
실제 최근 일본의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일본의 인구수는 지난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일본 총무성이 4월 발표한 2012년 10월 1일 기준 인구 추계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 인구는 2011년 같은 시점에 비해 0.22%(28만 4000명)가 줄어든 1억275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50년 일본 정부가 인구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 감소율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의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기존 거래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점도 일본 시장의 문제점이다. 양 교수는 “일본의 식품산업은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매출 상승을 꾀하고 있지만 기존 거래를 끊지 않는 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보화 시대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기존 방식에서 불필요했던 부분을 버리지 못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종합 소매점(GMS)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감안한다면 할인매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기존 거래 관행을 버리지 못해서 새로운 업태를 키우지 못하게 된 셈이죠. 매출 정체와 유통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한 것입니다.”
한국-일본, 소비패턴 차이 뚜렷
양 교수는 “결국 한국과 일본 시장은 지향점이 다른 시장”이라며 “소비패턴이 달라서 우리나라 마트들이 일본과 다른 독자노선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과 일본은 식품의 소비 패턴이 다르다. 양 교수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소비자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 한국과 일본 소비패턴 비교
한국
일본
주 1회
구매 빈도
주 3~4회
저장식품
주요 품목
신선식품
대형마트, 슈퍼마켓
구매 장소
슈퍼마켓
일본은 일주일에 3~4회 식품을 구매한다. 반면 한국은 일주일에 1회다. 따라서 일본은 신선식품을, 한국은 저장식품을 많이 구매하는 패턴을 보인다. 식품 구매가 빈번한 만큼 일본은 소량상품을 많이 소비하고 냉장고도 300~400ℓ를 주로 사용한다. 한국은 대량구매 위주로 600~700ℓ 냉장고를 주로 사용한다. 결국 산지에서 대량으로 들여와야 하는 게 한국 시장만의 구조라는 게 양 부교수의 주장이다.
또 신선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일본 소비자들에 비해 한국 소비자들은 저장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만큼 신선도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밥, 국, 냉장고 반찬을 주로 먹는 우리나라 소비자들과 일본 소비자들은 식습관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고부가가치 상품, 중국 시장 개척 키워드
양 부교수는 향후 국내 유통시장의 비전도 제시했다. 우선은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다.
“국내 도매시장에 예냉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채소에 냉기가 있으면 좋은 상품인데 소비자들은 안 좋은 상품으로 인식하죠.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이다. 한·중·일 세 나라에서는 고급식품을 원하는 인구가 많다. 일본은 방사능 유출 사건으로 신뢰가 떨어졌고, 중국은 제조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우리에게는 기회다.
그는 “한국은 고급 상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최적의 나라”라며 “중국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인구가 우리나라의 2배인 만큼 중국 시장 개척은 국내 식품산업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 안정에 집중하는 최근 국내 정책으로는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인다.
“고부가가치 상품과 벌크 상품을 구분해서 물가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각각 소비하는 계층이 따로 있는데 일괄적으로 물가 안정 정책을 적용하면 고부가가치 상품 산업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벌크 상품들의 저렴한 가격은 유지하되 부자들이 소비하는 상품까지 저렴하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키우지 않으면 중국과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 양석준 교수는>>
2000년까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농산 및 축산 바이어로 근무하다 교수로 전향한 유통 전문가다. 강단에서 유통업계 현황을 강의하기도 하지만 생산자 및 기업체 대상 컨설팅도 병행하며 국내 유통업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